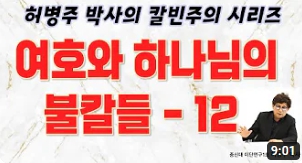|
비전트랩 둘째 날(4월 25일). 눈을 뜨니 새벽 5시였다. 첫날 묶은 호텔은 ‘앙코르 홈 호텔’. 하룻밤 숙박료는 75달러로 시엠립(Siem Reap)에서 상급 호텔이라고. 격이 있는 호텔로 소개받았는데 시설은 한국의 모텔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커튼을 걷으니까 하늘은 무엇이 못마땅한지 잔뜩 찌푸리고 있었다.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니까 몸이 가뿐했다. 방을 함께 사용한 한희창 장로님과 명함을 주고받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7시 조금 못되어 식당이 있는 1층으로 내려갔다.
아침은 뷔페식이었다. 볶음밥에 계란 부침, 토마토와 파인애플이 들어간 야채샐러드, 튀김 등을 골라 먹었다. 어묵이 들어간 탕국은 국물이 담백하고 매콤해서 입맛에 맞았다. 특히 수타면 비슷한 쌀국수는 별미였다. 더 먹고 싶었지만 컨디션 조절을 위해 참았다. 밖에는 열대지방에서나 볼 수 있는 굵은 장대비가 내리고 있었다. 전날 밤 마파람 때문에 비행기가 늦어졌다는 안내방송이 떠오르며 웃음이 나왔다. ‘마파람은 비를 몰고 온다.’는 옛날 어른들 말이 수만 리 떨어진 외국에서도 통하는 것 같아서였다.
열대의 나라에서 장대비를 감상하며 먹는 아침은 낭만이 있어서 좋았다. 일정에 차질이 있을지 몰라 걱정이 되기도 했다.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올라가 짐을 챙겨 내려오니까 날씨가 거짓말처럼 개어 있었다. 열대지방 날씨는 종잡을 수 없다는 말을 실감 나게 했다. 일행 몇이 호텔 로비에서 석 선교사와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석 선교사는 캄보디아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했다. 국토는 남한의 두 배 정도, 인구는 1천4백만, 농업이 주업이란다. 시엠립에서 수도 '프놈펜(Phnom Penh)'까지는 버스로 6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앙코르 왓 유적이 있는 크메르 민족 왕조는 시엠립 지역에 있었는데 15세기쯤에 서쪽 이웃인 타이의 공격을 피하여 처음으로 프놈펜을 왕도로 정했다 한다. 그 후 베트남의 공격을 피해 ‘우동(Oudong)’을 왕도로 삼았으나 1867년 프놈펜으로 수도를 옮겨 지금에 이르고 있단다. 캄보디아 영토에 있는 사원(寺院) 소유권 문제를 놓고 국경지대에서 태국과 총격전이 벌어지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전날(24일)에도 총격전이 벌어져 5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30여 명이 부상을 당했단다. 전쟁터에서 선교활동을 펼치는 선교사들이 대단하게 보였다. 여성 일행이 어이없어 하는 표정으로 걸어왔다. 그는 전날 석 선교사가 “화장실에 있는 물 두 병은 마셔도 되지만, 냉장고에 보관된 물을 마시면 요금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하기에 만지지도 않았는데 3달러를 지불했다며 울상을 지었다. 억울했지만, 웃고 넘길 수밖에 없었다. 캄보디아는 ‘오토바이 천국’
호텔에서 경험한 일들을 화제로 얘기를 나누는데 백준호 목사님이 우리가 타고 갈 버스가 도착했다며 빨리 나오라고 했다. 폭우가 한바탕 쏟아진 거리의 가로수들이 싱그럽고 청량하게 느껴졌다. 호텔 앞 천막에는 오토바이 수십 대가 질서 있게 보관되어 있었다. ‘오토바이 천국’답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토바이가 주요 이동수단인 캄보디아에서는 오토바이 한 대에 세 명이 타는 것은 기본이라고 한다. 다섯 명이 타기도 한단다. 그렇게 정원초과를 상시로 해도 오토바이끼리 부딪치는 사고는 거의 일어나지 않으며 승용차와 충돌사고는 가끔 일어난다고. 버스에 올라 이종예 회장의 기도로 비전트랩 둘째 날 일정을 시작했다. 현지 가이드가 도착하지 않아 기다려야 했다. 석 선교사는 가이드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데 비가 내려서 조금 늦는 것 같다면서 가이드에 대해 설명을 해주었다. “캄보디아는 현지 가이드가 동승해야 관광 투어를 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해주기 위한 방책이기도 하지요. 이곳에는 한인이 700여 명 있는데 그중 300명은 가이드로 일하고 있습니다.”
설명이 끝나기 무섭게 현지 가이드 ‘사몬’(26세)이 도착했다. 사몬은 어려서 그런지 쑥스러워했다. 승객이 모두 나이 든 어른들이니 어려울 수밖에. 석 선교사는 ‘앙코르 왓’ 전문 가이드라며 자신이 강의를 나가는 대학에서 한국어를 전공한 제자라고 소개했다. 사몬은 어눌한 한국어로 “안넝하세요. 만나아서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라며 자신을 소개했다. 캄보디아의 아픈 역사(킬링필드)와 시엠립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했다. 예(禮)를 갖추려고 노력하는 그는 석 선교사 말처럼 무척 순진하고 착하게 보였다. 석 선교사가 ‘똔네삽 호수’에 다녀오면서 ‘밥퍼 공동체’에 들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다. ‘앙코르 왓’을 첫 코스로 잡으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일정을 망치기 쉽다는 것. 의견은 금방 하나로 모아졌고, 버스는 ‘똔네삽 호수’로 방향을 잡았다. 시계를 보니 오전 8시10분이었다. ‘똔네삽 호수’ 가는 길
석 선교사는 시엠립에서 똔네삽 호수까지 도로는 한국의 현대건설이 공사했다고 귀띔했다. 동양에서 가장 큰 호수가 ‘똔네삽 호수’라고 하자 이종예 회장이 “세상에서 가장 큰 호수는 ‘내 마음의 호수‘입니다!”라고 받아서 한바탕 웃음바다가 되기도 했다. 거리에는 오토바이를 개조한 일명 ‘툭툭이’를 타고 관광하는 관광객들이 눈길을 끌었다. 기본요금은 2달러, 가난한 나라답지 않게 고급 승용차도 심심찮게 보였다. 싱싱한 바나나가 주렁주렁 매달린 과일가게도 자주 눈에 띄었다. 캄보디아는 1년을 우기(5월~10월)와 건기(11월~4월)로 나뉘는데, 건기의 아침저녁은 우리나라 초가을 날씨이고, 4월~5월은 한낮 기온은 섭씨 40도를 오르내린다고 한다. 찜통더위가 이어지는 대신 열대야 현상은 없다고 한다.
시내를 벗어나니까 양편으로 너른 평야가 펼쳐지면서 한국의 농촌을 떠오르게 했다. 물이 고인 논들이 자주 보였고 들판에서 풀을 찾는 소들이 시야에 들어왔기 때문. 기후 조건으로는 3모작도 가능하지만, 물이 부족해서 1모작에 그치는 논들이 대부분이란다. 덥기는 해도 습기가 없어 피부가 끈적이지 않아서 좋았는데, 열대의 나라임에도 거리에는 손목까지 내려오는 긴소매 옷차림의 여인들이 많았다. 무척 덥고 답답하게 보이기에 물었더니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석 선교사는 캄보디아 농촌의 결혼문화에 대해 설명했다. 한국의 데릴사위처럼 신랑이 얼마의 지참금을 가지고 신부 집으로 들어가 한동안 일하면서 신혼을 보낸다고. 오토바이 한 대 가지고 있으면 괜찮은 신랑감으로 인정받는다고 해서 웃음이 나왔다. 석 선교사의 구수한 입담과 재치에 흠뻑 빠져 시간가는 줄도 몰랐다. 버스가 똔네삽 호수에 도착하는 것도 몰랐기 때문. 현지 가이드 사몬의 얘기를 듣고 창밖을 보니 말로만 듣던 ‘똔네삽 호수’ 선착장 풍경이 눈에 들어왔다. 시계는 오전 8시 45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저작권자 ⓒ 국제기독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인기기사
해외선교 많이 본 기사
|